15호 인터넷트렌드
네티즌은 공짜족(?)
조회수: 5035 / 추천: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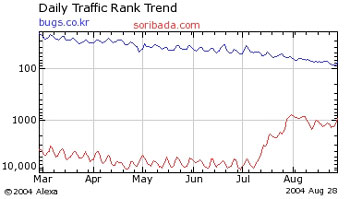 |
네티즌 무임승차(?), 기업의 부당이득과 불공정거래에 저항하는 것
다른 한편에서는 사뭇 양상이 다르다. KT가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겠다’며, ‘IP공유기 사용을 막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이 방면에서는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 VPN 업체들은 납작 숨을 죽이고 있지만. 논리대결은 간단하다. KT는 ‘전체 트래픽의 70% 이상을 20% 가량의 헤비유저들이 발생시키고 있다’며 요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네티즌들은 트래픽이 70%이건 100%이건 간에 개별 회선상에서 계약상 제한된 트래픽만을 사용할 뿐이라며, KT가 부담해야 할 설비투자분을 회선사용계약조건에 맘대로 반영하느냐는 것이다. 당연히 사용자로서 네티즌의 종량제 반대 논리에 더 공감이 간다. 더군다나 종량제를 적용할 경우 20%의 트래픽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요금 감면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음에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두 가지 양상에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네티즌의 무임승차’에 대한 비난이 공통적으로 논리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공짜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KT나 하나로 같은 인터넷 회선 제공업체에 돈을 내지 않고서는 아무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 학교나 회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역시 간접적으로 그 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런데도 네티즌들은 ‘공짜족’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한다. 엄청난 수익을 남기며 현금을 세고 있는 KT와 하나로통신이 부른 배를 두들기고 있을 때 말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인터넷 업체들도 적자에 시달리는데 말이다. 정작 회선제공업체가 매기는 인터넷 사용요금의 구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지 오직 정보통신부의 관계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사용자들이 이미 지불하고 있는 요금이 다른 인터넷 업체들이 나누어 가져야할 몫이라는 점은 정부연구기관이 조사한 각국의 인터넷 사용요금의 비교에서도 잘 나와있다. 비록 그 보고서가 정부가 세금으로 이미 지불해준 부분을 빼고 계산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더욱이 회원가입을 하면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또다른 형태의 이용요금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네티즌이 공짜족이라고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정정돼야 한다. 사적 기업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강요된 불공정거래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오히려 사용자들의 ‘저항’을 이용해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네이버의 카페와 블로그 서비스가 그것이다. 누구는 ‘전지현효과’를 말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다음이 해왔던 카페 서비스의 한계효용에 대한 네티즌들의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미 지불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효과에 비해 다음의 서비스는 그에 걸맞는 효용을 기대치만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얘기다.
문화의 공유 vs 저작권, 상품가치에 대한 타협아래에서 가능
문화 역시 자본주의에서는 상품이다. 음악과 영화, 도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각종 문화콘텐츠들, 지적창작물들은 자신의 지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상품으로서의 존재가치에 대해 반문해 봐야 한다. 지적 창작물들은 결국 인류 공동의 유산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은 분명히 진실이다. 인류 공동의 자산인 문화의 공유와 저작권이라는 자본주의적 가치의 양립은 결국 상품으로서의 존재가치에 대한 타협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유료로 판매하고자 하는 지적 창작물들이 겉보기에 P2P를 통해 광범위하게 공짜로 공유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이미 그 대가가 지불된 것이라는 사용자들의 인식에 기반한다. 지적창작물들을 판매하고자 하는 저작(인접)권자들이 숙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만약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지적재산권’은 다수에 대한 소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이미 대가가 지불된 것이라면, 그것은 제공된 대가를 공유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ISP가 독점하고 있는 요금은 분명히 ‘사적복제보상금’같은 측면에서 재고돼야만 한다.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용자들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네트워크상의 자본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을 것이다. 이미 초토화된 대지를 점령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히려 자본의 또다른 이름인 저작(인접)권자들은 방송사나 또는 SKT같은 거대 자본들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부분은 관대하면서, 일반 사용자들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에는 단호하다. 예컨대 음반제작자협의회가 모든 것을 불문하고 모든 MP3폰에는 MP3 사용에 제한이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그럼에도 자신들의 저작물 사용에 대해서는 관대하기만 하다. YBM이나 예당같은 음반사들이 음반을 생산하면서 샘플링하는 수많은 음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는가.
공짜는 자본이 좋아한다
오히려 공짜는 자본이 좋아한다. 요즘 경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문서서식’의 판매, ‘도서 및 논문 원문 제공’이 그것이다. 포털들은 과연 그 많은 저작물들의 원저작자들에게 상업적 이용허가를 받았을까? 더욱 가관인 것은 블로그나 카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포털들이 동의하기를 요구하는 약관에 있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공짜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라니.















